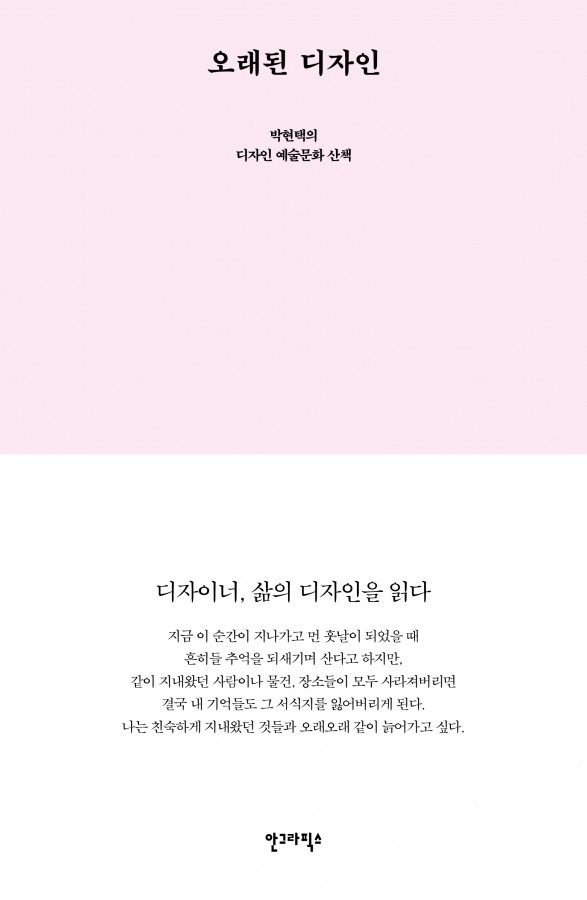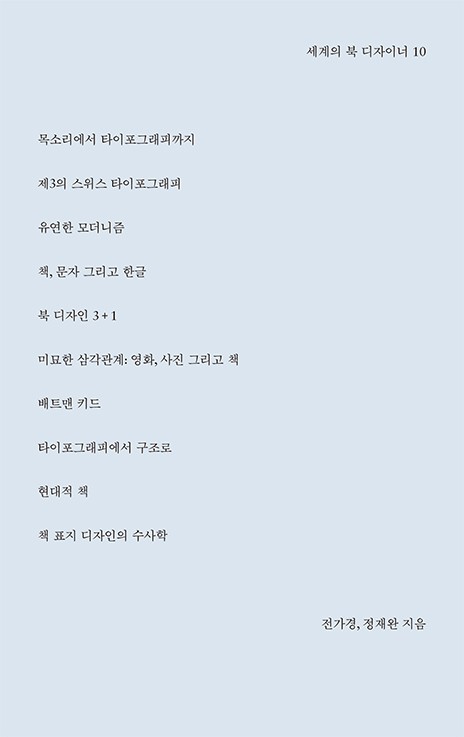What if design someday becomes truly “normal”? Wouldn’t that be truly “super”?
The hidden charm of the extraordinary within the ordinary: Super Normal.
Naoto Fukasawa and Jasper Morrison, two renowned product designers, explored the concept of Super Normal, reviving objects that felt far from special—items so ordinary they are used daily without a second thought—into something extraordinary.
Super Normal is a celebration of unassuming objects that quietly improve our quality of life. The book features descriptions of over 50 selected works and a catalog of more than 200 objects, curated by Morrison and Fukasawa under the Super Normal theme. Though not a thick volume, it conveys the essence of design more precisely than many dense theoretical texts.
The book’s concise and unembellished content mirrors the simplicity of the featured products and the overall design. Photos and text are spaciously arranged, offering the reader the sensation of viewing each piece in a gallery setting. The highlight is the interview with the two authors, where readers gain insight into the minds of these leading product designers.
Through this book, readers are introduced to a world of comfort, trust, radiant simplicity, and restrained elegance. By showcasing some of the objects from the Super Normal exhibition, it invites us to rethink what constitutes “good”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