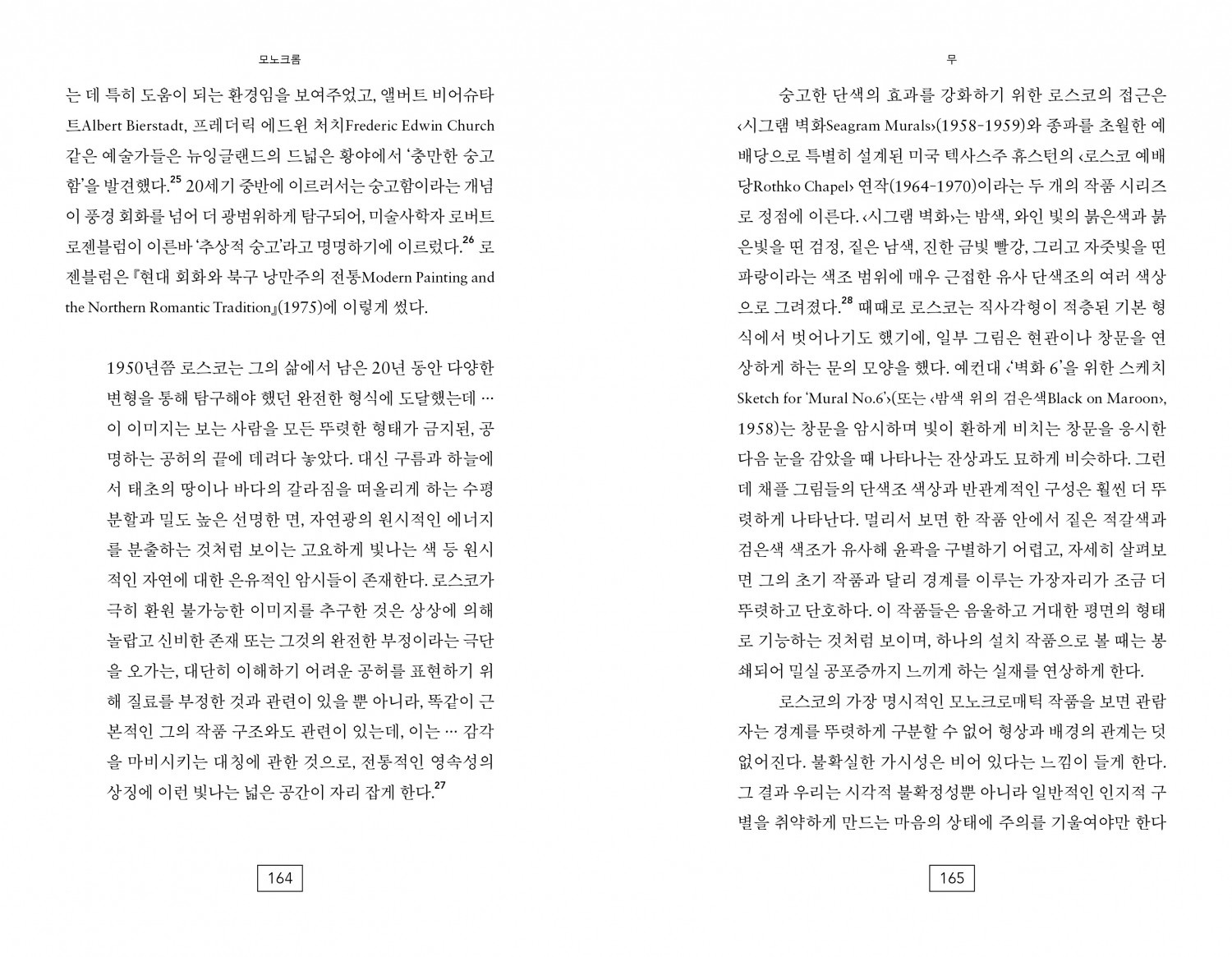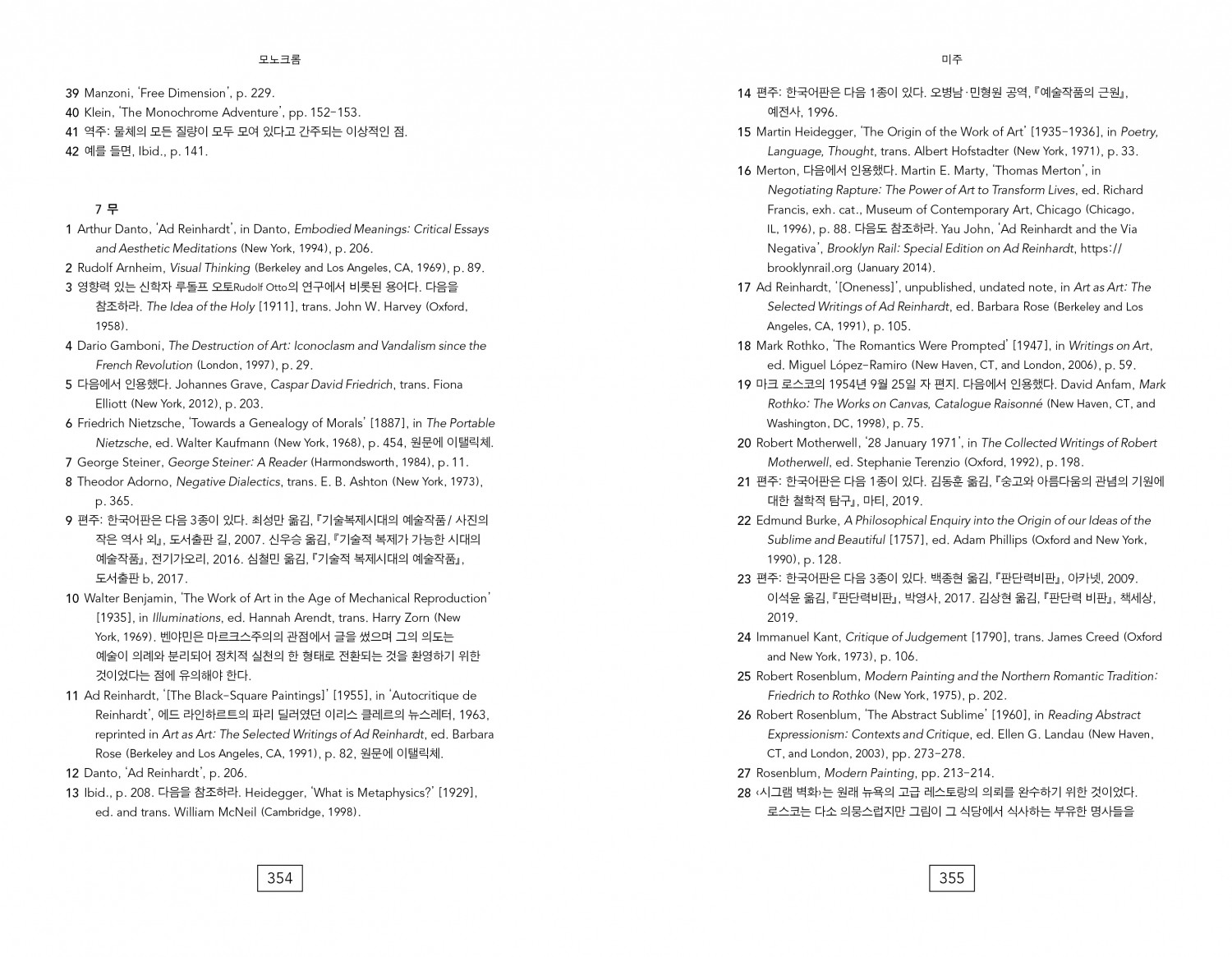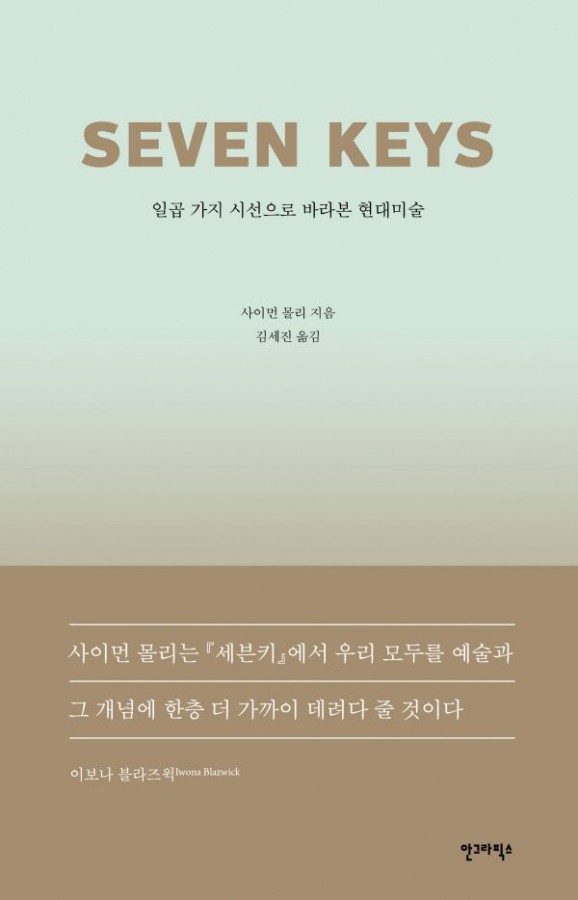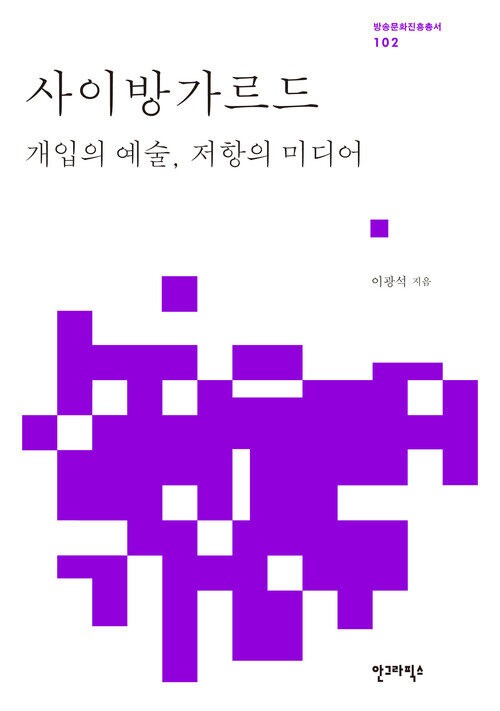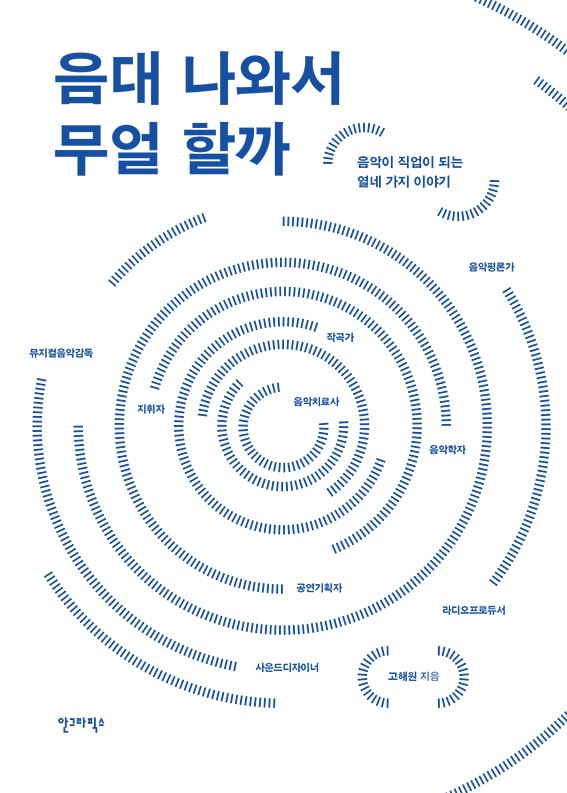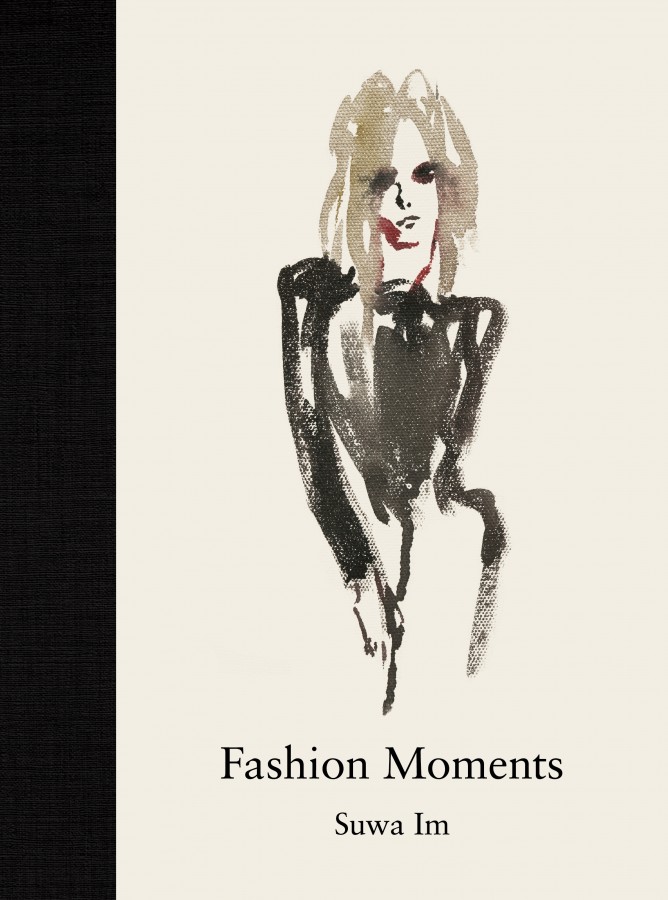예술가들은 왜 캔버스에 한 가지 색만 칠했는가
현대 미술의 ‘단순한 진리’ 모노크롬에 대하여
“이미지는 없고 물감만 가득 칠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실의 부정이나 새로운 종류의 사실주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모노크롬은 가장 보편적인 요소인 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난해한 의미를 담기 일쑤다. 모노크롬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장 지적으로 탐구하고 도전하는 예술가들의 영역이기도 하다.”
모노크롬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짜증 나는 모든 것의 상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예술이다. 『모노크롬: 이해할 수 없고 짜증 나는, 혹은 명백하게 단순한』의 저자 사이먼 몰리는 그 자신이 모노크롬을 그리는 미술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모노크롬이 탄생한 배경부터 수용되는 과정, 그 전성기, 그리고 오늘날 모노크롬의 역할을 풀어낸다. 서론과 결론을 제한 17장은 모노크롬에 있어 주요한 테마로 각자 묶였지만, 책 속의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고 테마는 모노크롬의 연대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식이다.
등장하는 작품은 모노크롬과 ‘이상적인 모노크롬에서 벗어난 연속체’인 모노크로매틱과 덜 본질적인 모노크롬의 예도 포함하며, 회화뿐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 영화, 사진, 레디메이드까지 확장된다. 저자는 모노크롬의 ‘세계적’ 역사를 담고자 했으나 서양에 치우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미와 동아시아의 모노크롬에 관한 논의로 이런 편향을 상쇄하고자 노력했다. 특기할 만한 건 한국의 모노크롬 회화 작품인 ‘단색화’에 온전히 한 장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내가 서양의 회화 장르라고 여겼던 모노크롬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나, 적어도 머나먼 한국까지 확대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또한 저자가 한국에 살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