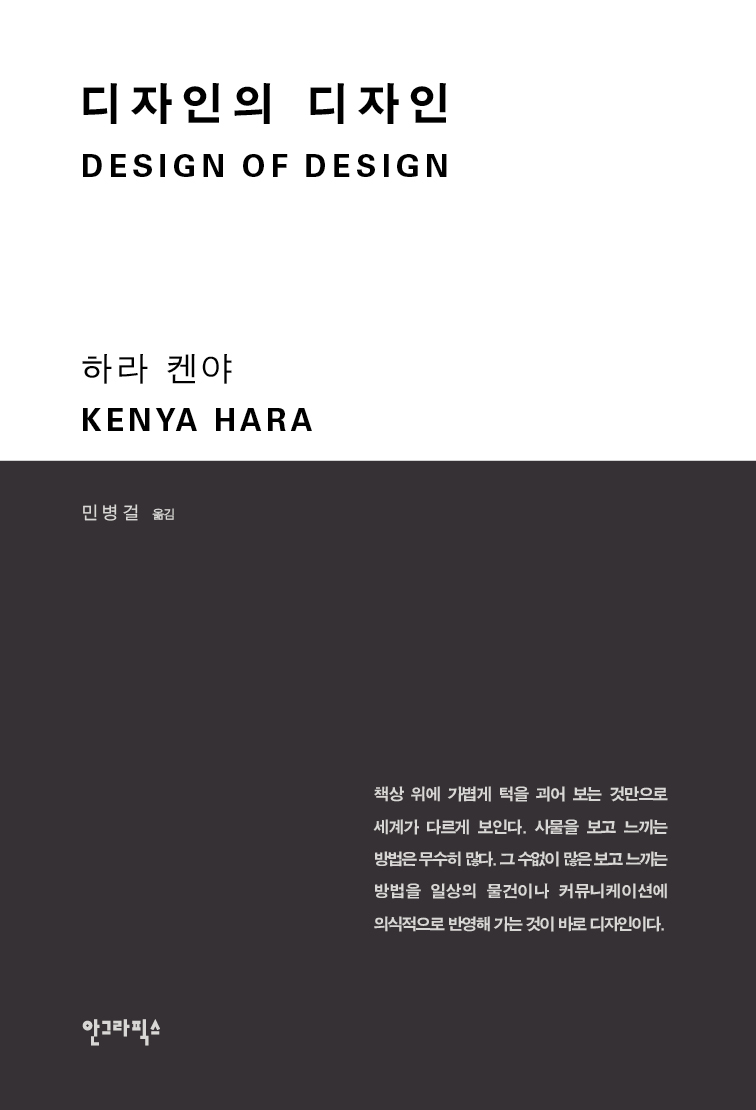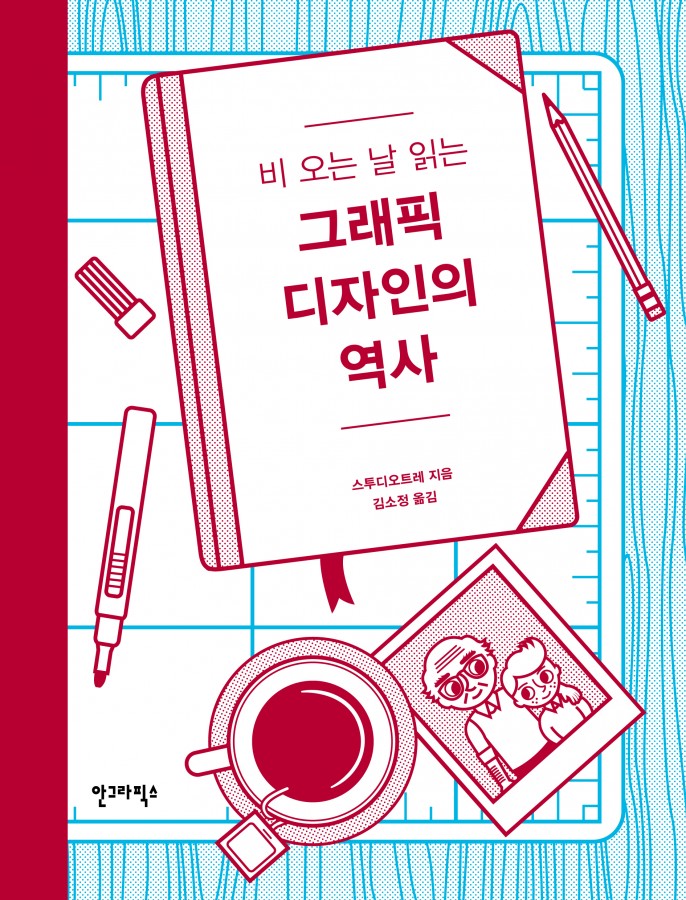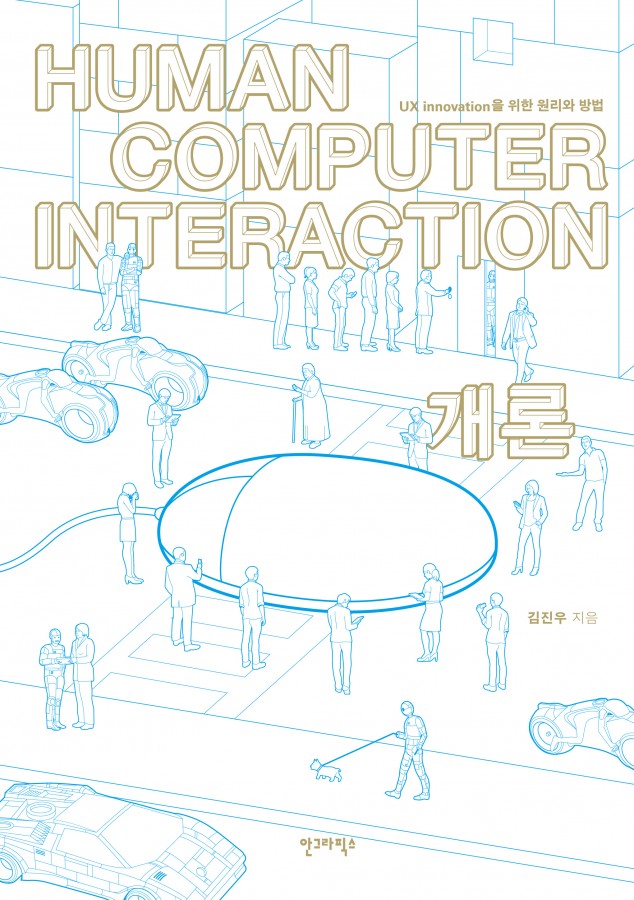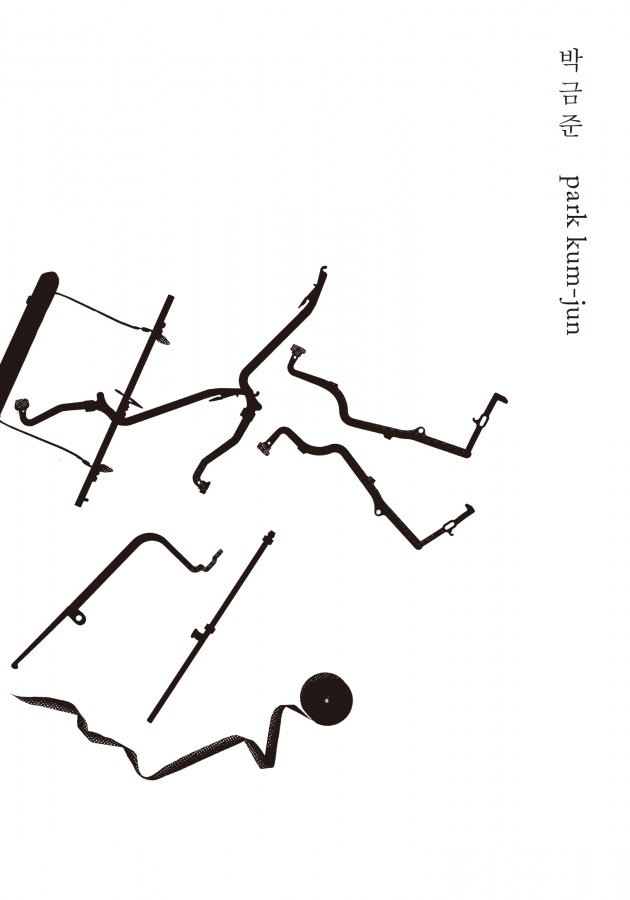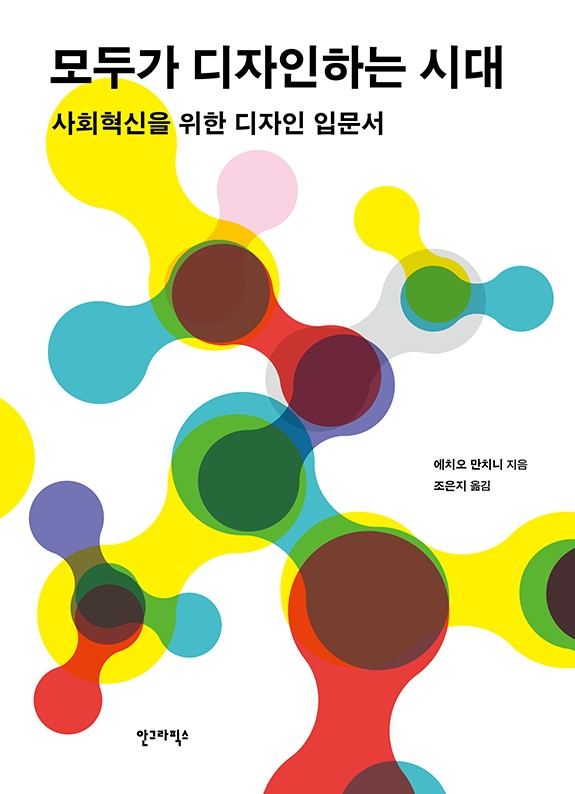Design: Consciously Reflecting Everyday Communication
Winner of the 26th Suntory Prize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Arts and Literature
What is design? Renowned designer Kenya Hara, known for his diverse contributions, reflects on his projects such as the Re-Design exhibition, art direction for MUJI, the renewal of Matsuya Ginza, the opening ceremony program for the Nagano Winter Olympics, and promotions for the Aichi Expo. Through these reflections, Hara offers his unique answer to the question of design.
His proposal to pause and encounter the unknown in daily life introduces a paradigm shift, challenging conventional perspectives on design. This book, which itself “designs the act of design” through language, has been lauded for its lucid sensibility, presenting the possibilities of design. It earned Hara the 26th Suntory Prize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Arts and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