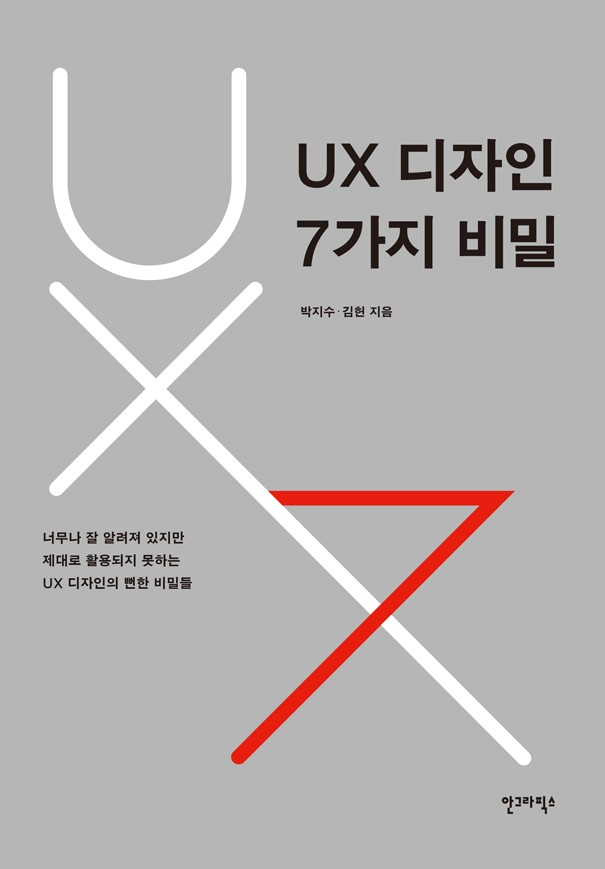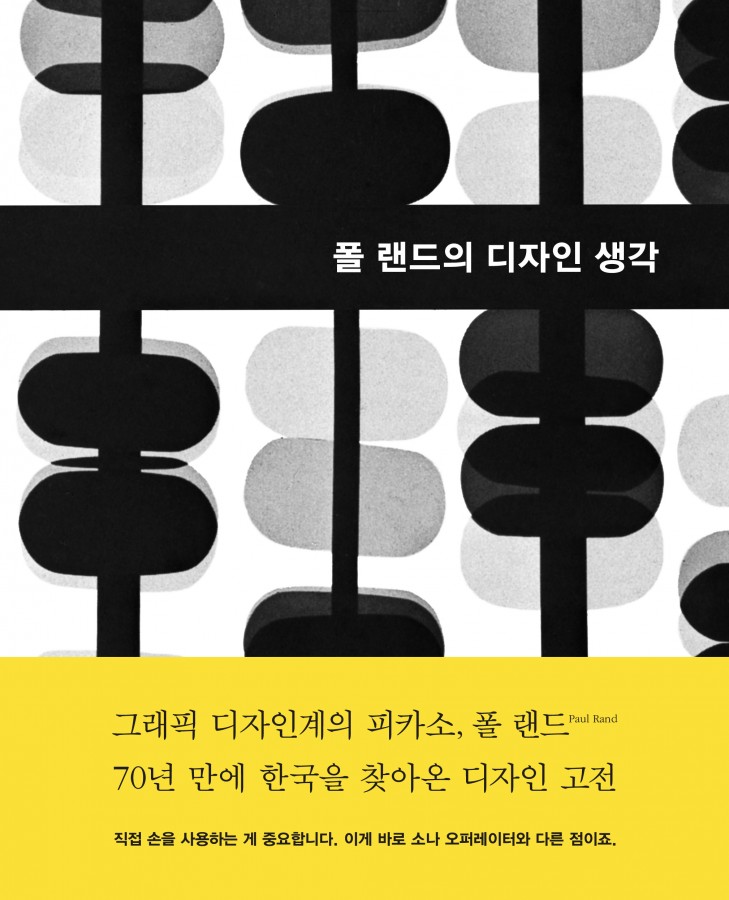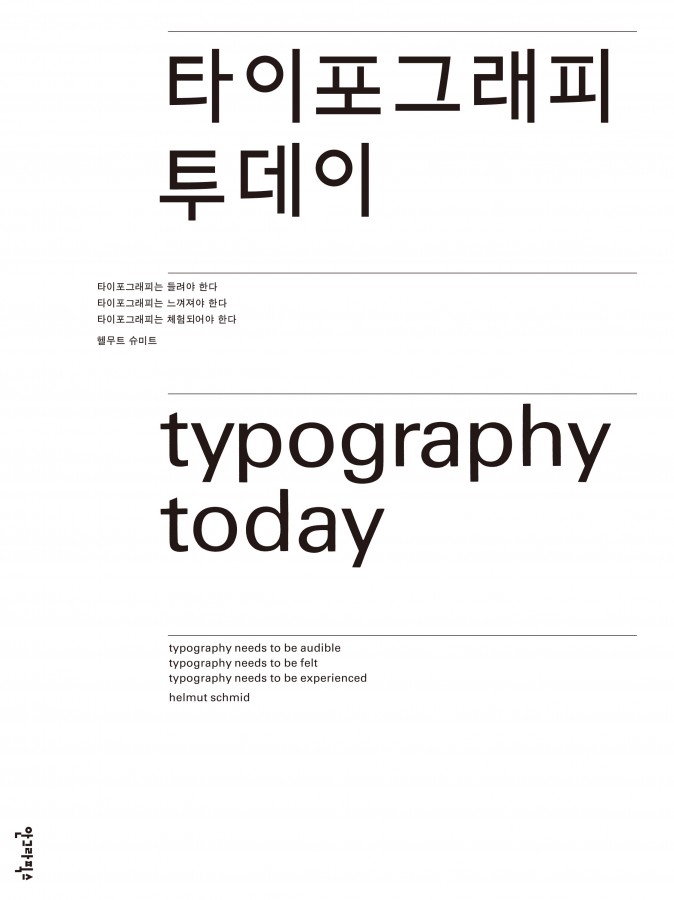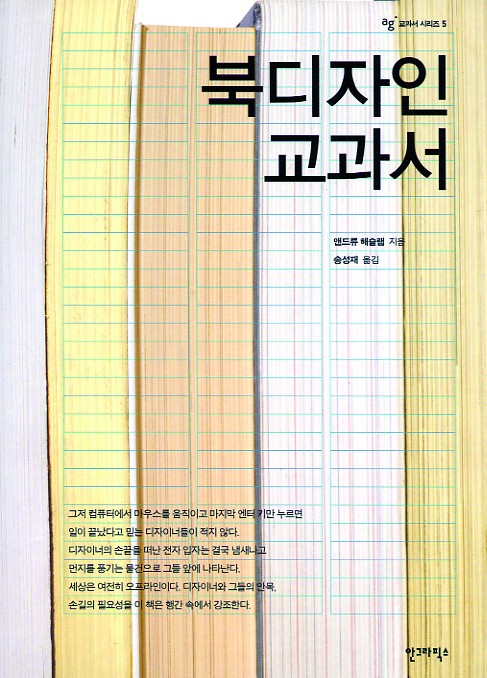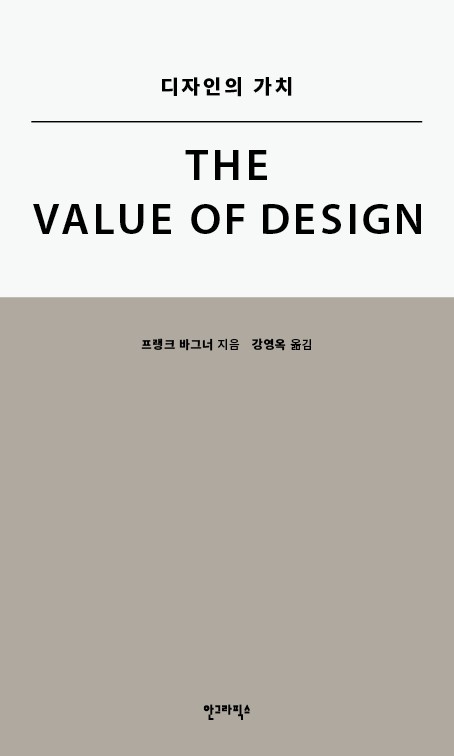비닐(Vinyl)이라고 쓰고 ‘바이닐’이라고 읽는 소위 LP 레코드의 음악사를 레코드 판, 레이블, 디자인을 통해 본다. 검은색 폴리염화비닐 알갱이가 녹아 바이닐 비스킷이 되고, 소리가 새겨져 마침내 프레스되는 과정과 LP 중앙을 장식하는 라벨이자 때로는 장르 그 자체를 대변하는 다양한 레이블의 이야기, 시대에 남은 앨범의 커버, 패키지 디자인과 턴테이블, 음악이 끝난 후 재생되는 숨겨진 런아웃 그루브 메시지 등, 디지털 음원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호황을 누리는 바이닐을 ‘감싼’ 것들에 대한 음악사다.
바이닐: 그루브, 레이블, 디자인
Vinyl: The Art of making Records
편집자의 글
바이닐이라는 몸을 둘러싼 소리골, 레이블, 커버 디자인에 대한 탐구와 예찬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핸드폰만 건드리면 바로 음악이 나오는 시대에 바이닐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좋게 말해도 다소 시대착오적인 듯하다.” 1877년 토머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개발한 이후로 공기를 진동시킨 후 사라져버리는 소리를 붙잡아두려는 노력은 투쟁이자 놀이였다. 조금이라도 더 귀에 들리는 소리와 가깝게, 공연장에서처럼 몇 시간을 끊김 없이 듣기 위한 노력은 투쟁이었고, 그럼에도 한 면에 20분 정도의 소리만 담을 수 있다는 제약 안에서 이뤄진 온갖 음악적 실험은 놀이에 가까웠을 것이다.
깍지벌레의 체액과 분비물을 정제한 동물성 수지인 셸락으로 레코드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소리는 몸을 갖게 되었다. 발화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물성으로 붙잡는 것이 레코드를 만드는 작업이고, 어쩌면 그것이 레코드 디스크의 처음과 끝일지 모른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 책의 첫 문장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는 굳이 이 몸이 필요하지 않다.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들어가면 거추장스러운 몸을 탈피한 평생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양의 음원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이후에는 LP는 물론이고 그보다 좋은 음질로 많은 양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의 판매량 또한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몸을 찾기 시작한다. 꾸준히 그 몸을 쓰다듬고 관리하며 들어온 LP 애호가들도 있지만, 디지털 음원이 더 익숙한 세대들도 원래 물성이 없는, 소리 그 자체의 특성과도 닮은 디지털 음원이 아니라 그것을 제약 속에 옮겨 놓은 LP를 찾고, 레코드숍이 다시 생겨나고, 음악가들 또한 기꺼이 제약 속으로 뛰어든다. 물리적 실체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인지도 모른다. 만지고 보는 데서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간에게는 그 정도로 중요할지 모른다.
바이닐에는 몸이 있어서 가능한 것들이 있다. 바이닐을 감싼 커버 아트가 그중 하나다. 1940년, 포스터 디자이너로 일하던 앨릭스 스타인와이스가 컬럼비아 레코드의 아트 디렉터 자리에 앉으면서 슬리브 디자인의 “역사가 꿈틀댄” 이후 1968년 영국에서 힙노시스 디자인 그룹이 등장해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등의 역사에 남은 앨범 아트를 디자인했다. LP 커버 디자인은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여겨졌고, 앤디 워홀은 가로세로 30cm 공간을 캔버스 삼아 벨벳 언더그라운드 & 니코의 커버에서 “‘천천히 벗겨 보라’는 문구“와 함께 특유의 세계를 펼쳤다.
”레코드의 음악이 끝나는 지점과 중앙의 라벨(레이블) 사이의 무음 구간“인 데드 왁스(런아웃 그루브라고도 한다)에 숨겨진 메시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통은 매트릭스 넘버라고 하는 음원의 고유번호를 넣는 자리이지만 ”창의력 넘치는 일부 엔지니어와 녹음 아티스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백에 메시지를 집어넣었다.“ LP의 중앙에 들어가는 라벨과 레이블 커버 디자인은 그 자체로 음악 장르를 대변하며, 음악사의 아이콘으로 남기도 했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목적은 음악 감상의 한 가지 방식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도록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닐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예찬하는 데 있다. 스테레오의 시작부터 게이트 폴드 커버, 콘셉트 앨범, 12인치 싱글, 앨범 아트, DJ의 샘플링에 이르기까지 바이닐은 우리가 아는 대중음악을 정의하는 데 이바지했다.” 디지털 음원이 더 익숙하지만 바이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감상자에게는 발견의 장을, 기존 애호가에게는 영미 대중음악사를 바이닐, 레이블, 디자인을 중심으로 보는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
책 속에서
핸드폰만 건드리면 바로 음악이 나오는 시대에 바이닐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좋게 말해도 다소 시대착오적인 듯하다. 그러나 디지털 전송 시스템의 무형성이야말로 70여 년간 우리의 음악 감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바이닐이라는 포맷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흔히 비닐이라 하는 ‘바이닐’은 폴리염화비닐(PVC)을 간단히 이르는 단어로, 원래는 검은 알갱이 형태다(컬러 레코드를 생산한다면 색은 다를 수 있다). 유압 프레스에 흡입된 알갱이는 고온에서 녹아 바이닐 비스킷으로 압착되어 나온다. 이 비스킷을 레코드 완성본의 각 면에 해당하는 두 스탬퍼 사이에 끼워 납작하게 편다. (…) 프레스 단계에서 라벨도 들어가니 프레스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완제품이다. 이것이 바이닐 디스크로서, 여러 세대에게 친숙한 녹음 기술의 찬란한 상징이다.
이론상 레코드의 소리골이 가까이 붙을수록 음질은 떨어진다. 따라서 LP 레코드에는 최적의 길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며 각 면의 길이는 최대 20분 정도에 재생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사이인 12인치 LP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78회전 레코드가 3분 정도의 길이였던 시절에 틀이 잡힌 주류 팝송이면 한 면에 최대 여덟 곡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는 모든 비틀스 앨범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예외는 딱 두 면뿐이다(‘The White Album’ 한 면과 《Abbey Road》 한 면).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아 하나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아트워크는 앨범 못지않게 혁명적이었다. “섹스 피스톨스가 돈 몇 푼 들이지 않은 제이미 리드의 커버를 내세워 《Never Mind the Bollocks》를 들고나온 순간 과하리만치 돈을 잔뜩 쏟아부은 우리의 초현실적 작업물은 조만간 명을 다하겠다는 걸 깨달았죠.” 힙노시스로 활동하며 핑크 플로이드 같은 밴드의 앨범에 옷을 입혔던 오브리 파월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1979년 소니의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이 출시되면서 바이닐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젊은 세대가 이동 중에 녹음된 음악을 듣는 일이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턴테이블 제조사의 대응은 고급형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엔지니어 중심 디자인의 초기 사례가 나왔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지만 음반 매장이 작은 도시마다 못해도 하나씩은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무형의’ 음악을 공급하는 업자들과 경쟁할 것 없이 바이닐을, 나중에는 CD를 열심히 판매하던 곳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곳은 극소수지만, 그 일을 해낸 매장들은 바이닐 부흥의 선봉에 서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반 거래업자와 레코드 소매업자, 바이닐 판매업자를 여기에 조금이나마 추려보았다. 패러노이즈The Paranoids가 남긴 불후의 가사를 빌리겠다. “음반 매장에서 만나자/팝록 칸에 있는 멍청이들을 같이 째려보는 거야.”
마지막 소리골과 바이닐 라벨 사이의 데드 왁스(런아웃 그루브)에는 다른 요소 없이 매트릭스 번호만 넣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창의력 넘치는 일부 엔지니어와 녹음 아티스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백에 메시지를 집어넣었다. (…) 가장 악명 높은 런아웃 그루브 메시지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두 번째 앨범 《This Year’s Model》(1978) A-side에 있다. 내용은 이랬다. “특별한 003번 프레싱. 특별 상품을 원한다면 434 3232로 전화해 모이라를 찾으세요.” 이 전화번호는 진짜였고, 나날이 웃음을 잃어가던 모이라에게 연결되었다. 모이라는 ‘WEA’ 레이블에서 일하는 코스텔로의 언론 홍보 담당자였다.
차례
들어가며
The Early Year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그리고 다시 바이닐
도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