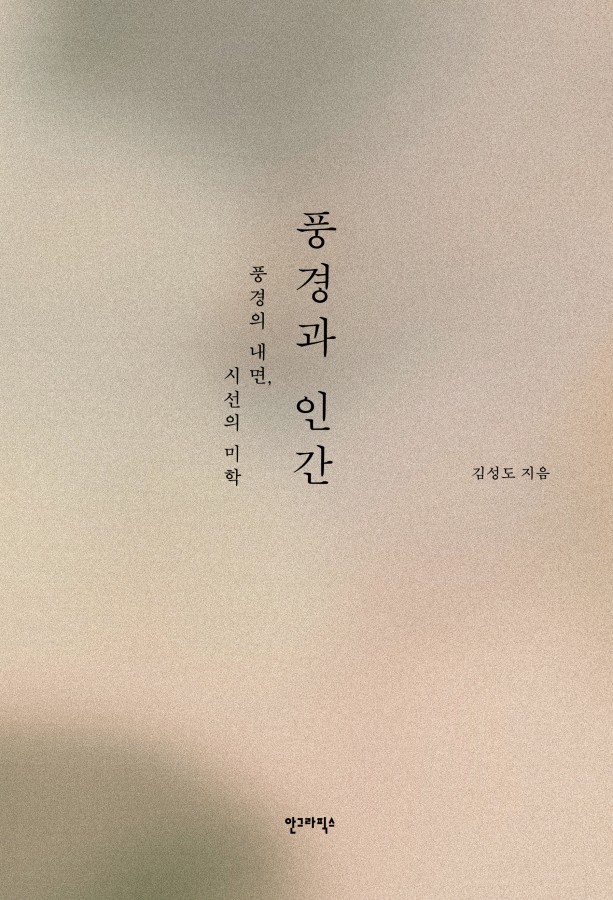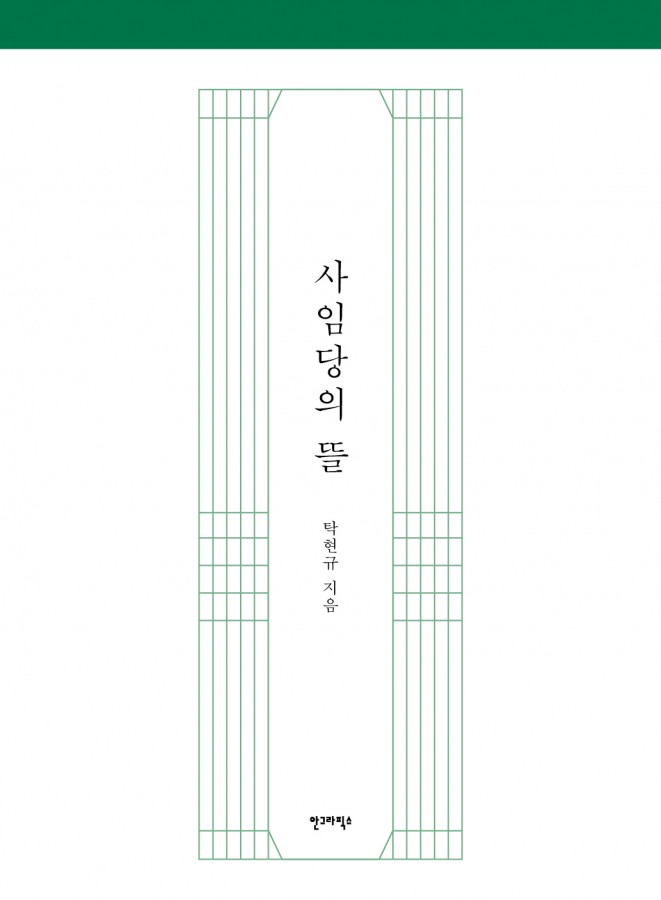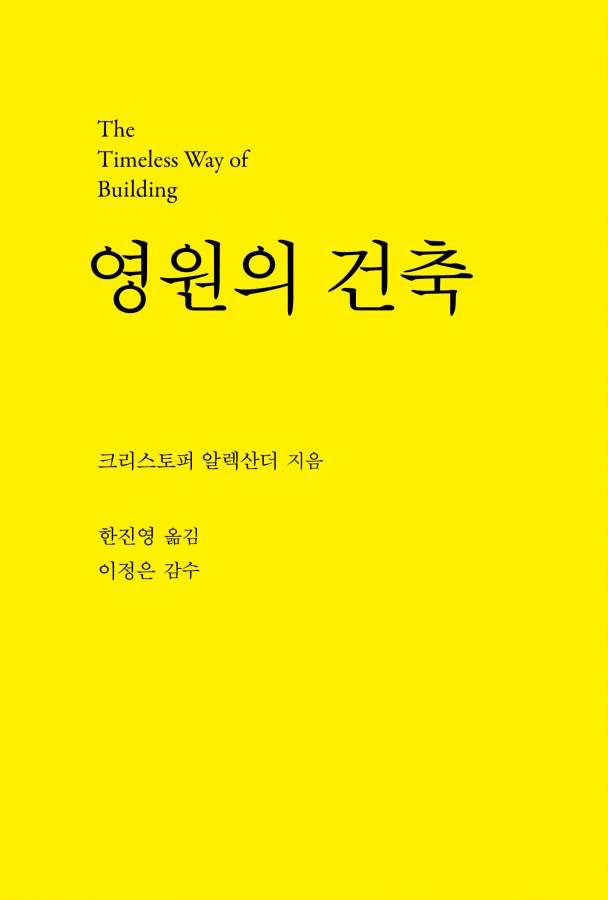“침묵의 영원 속에서 우리 기억 속의 색들이 자취를 감추기 전에…”
기억 속에서 서린 색의 향연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이라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즉시 그 색을 지닌 사물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색의 관한 고찰』 중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색들 중 어떤 것이 남아 있는가? 빨간 바지, 파란 토끼, 노란 자전거로부터 간직되는 기억은 무엇인가? 우리의 학창 시절에, 우리의 첫사랑에, 우리의 삶에서 색은 어떤 존재인가? 색은 우리 기억의 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색은 기억의 변덕이나 발작에 어떻게 희생되는가?
미셸 파스투로가 반세기가 넘는 세월(1950-2010)에 걸쳐 기록한 색의 기억. 유행과 패션, 일상생활, 예술과 문학, 신화와 상징, 취향, 언어와 어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찰의 장에서 색의 역사를 훑고 환기한다.
색을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수 세기가 흐르는 동안 색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했으며, 현대에만 국한시켜도 5개 대륙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여러 문화들은 자연환경, 기후, 역사, 지식,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르게 색을 이해하고 정의한다. 이때 서구의 지식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다른 여러 지식들 가운데 존재하는 지식일 뿐이다. 또한 서구의 지식이 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는 자서전적이고, 인문학에 속한다. 저자 미셸 파스투로는 여러 해 동안 색의 역사와 상징에 관해 연구하면서 점차 이 책에 대한 착상을 싹틔웠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반세기가 넘는 개인의 역사, 프랑스 및 유럽 사회의 역사와 관련된 색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 용례와 규범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은 전적으로 자아도취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공상적이기는 하다. 적어도 195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60년에 걸쳐 색에 관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증언하려는 욕구, 그 역사와 변천을 되새겨 서술하고, 그 영원함과 변화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욕구, 그 사회적, 윤리적, 예술적, 시적, 몽환적 쟁점을 강조하려는 갈망에서는 그렇다.
이 책은 어려운 작업, 거의 공상에 가까운 작업이다. 역사학자는 ‘자기 시대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셸 파스투로는 이 작업에 빠져들었다.
이 책의 구성
하나.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고도 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렇다. 이 책에는 시각적 이미지들이 없다. 하지만 그 어느 색 견본집보다도 무궁무진한 색의 상상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색을 위한 라디오’라 할 수 있다.
둘. 이 책에 컬러 이미지들이 없어서 오히려 독자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색이 추상적인 개념이며, 지적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색은 단어이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자주 현실과 격차를 보이는 변화무쌍한 명찰이다.
당신의 기억 속의 색들을 모두 꺼내어 보자. 어쩌면 이 책은 저자의 기억력과 상상력, 그리고 독자의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생기 넘치는 색의 옷을 입히게 할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급하는 색은 모두 저자의 어린 시절과, 색에 관한 오래된 기억과 결부되고, 때론 이따금 저자의 상상력이 그 공백을 메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글 속에서, 단어 속에서 색의 포로가 된다.
색에 관한 이 책은 덧없이 사라지는 인상, 개인적 기억, 실제로 겪은 경험들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취한 묘사, 학술적 여담, 문헌학자와 사회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의 언급에 의지한다. 그러면서 어휘들과 사실들, 옷과 유행, 일상용품과 생활 습관, 문장(紋章)과 국기, 스포츠, 문학, 그림, 예술적 창조 등 수많은 분야를 관통할 것이다.